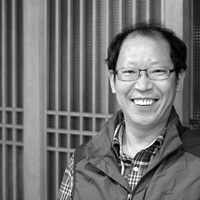
전신, 내 별명이다. 전을 귀신 같이 잘 부친다는 뜻이다. 제사 때, 통상 전을 붙잡고 서너시간 씨름하지만, 나는 1시간 남짓이면 끝낸다. 그렇다고 날림이냐? 그러면 전신이겠는가?
몇 해 전, 엄니가 온갖 아픈 부위를 열거하면서 제사에 대해 화이트아웃을 선언했을 때, 각시의 표정은 굳어졌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제사 지내기가 힘들다. 내년부터 서울로 모셔 가거라.”
“…”
난처한 침묵을 깨고, “그렇게 할랍니다.”고 내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라는 소리를 뒤로 하고.
우여곡절 끝에 각시와의 별도협상에서 양자는 3개항에 합의했다. ‘제사 당일 월차를 낸다. 모든 전은 내가 부친다. 설거지도 내가 맡는다.’
월차는 당연히 내면 되고, 설거지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목기 대신 스텡 제기를 45만원 주고 장만했다. 몰아넣고 씻어버리면 그만이다. 문제는 전이다. 제사는 전이 절반이다.
나는 전에 대해 탐구했다. 전은 불 조절이 핵심이다. 팬에 막 넣었을 때는 온도가 높아야 한다. 손에 열기가 전해질 때, 기름을 충분히 두르고 밀가루와 계란을 입힌 것들을 투입한다. 조금 기다려 불을 약간 낮추고, 표면의 물기가 거의 사라질 때 뒤집는다. 그리고 살짝 놀러준다. 이 때 불을 약간 올렸다가, 잠시 후 바로 줄여야 한다.

대형 팬 2개로 전을 부치는데 검은 바닥이 안보일 정도로 쫙 깐다. 왼손으로는 불 조절하고, 오른 손으로 쉴 새 없이 뒤집는다. 노릿노릿하면 즉각 꺼내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투입하고, 뒤집고…
나는 통상 연간 4~5회 전을 부친다. 대개 육전, 해물전, 명태전, 굴전, 파래전 하여 5종이다. 하도 잘 부치니까, 제사 때만 부치던 것을 명절 때도 부치게 됐다. 육전 노하우를 하나만 전하면, 고기를 뜰 때, 쇠고기가 약간 언 상태에서 2mm 두께로 잘라달라고 해야 전 지지기에 제일 좋다. 뻣뻣할 때, 밀가루와 계란을 잘 입힐 수 있다. 먹기도 좋고, 빨리 익는다.
어느 순간 가족들이 놀라기 시작했다. 남보다 2배 빠르니까 놀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새 다 지졌냐?”와 “전집 차려도 되것다!”는 말이 내가 제사 때 많이 듣는 말이다.


제사는 그렇게 광주에서 서울로 안착했다. 한 5년 전을 지지니 이골이 난다. 역시 갈등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문제가 풀린다. 낼모레 기일이다. 나는 좀 더 창의적인 전을 구상하고 있다.
학교로 치면 졸업할 때가 온 것이다. 인상파에 반발하여, 포비즘이 태어난 것처럼,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나만의 전은 어떤 것일까? 아! 아직은 벅차다. 조상님들이 그런 내막을 아실까?
** <절창화담>은 산사 이야기와 범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연재를 맡은 이광이 님은 <무등일보> 노조위원장과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원 그리고 도법스님이 이끈 조계종 총무원의 자성과 쇄신 결사에서 일 했습니다. 저서는 동화 <엄마, 왜 피아노 배워야 돼요?> 등이 있습니다.

